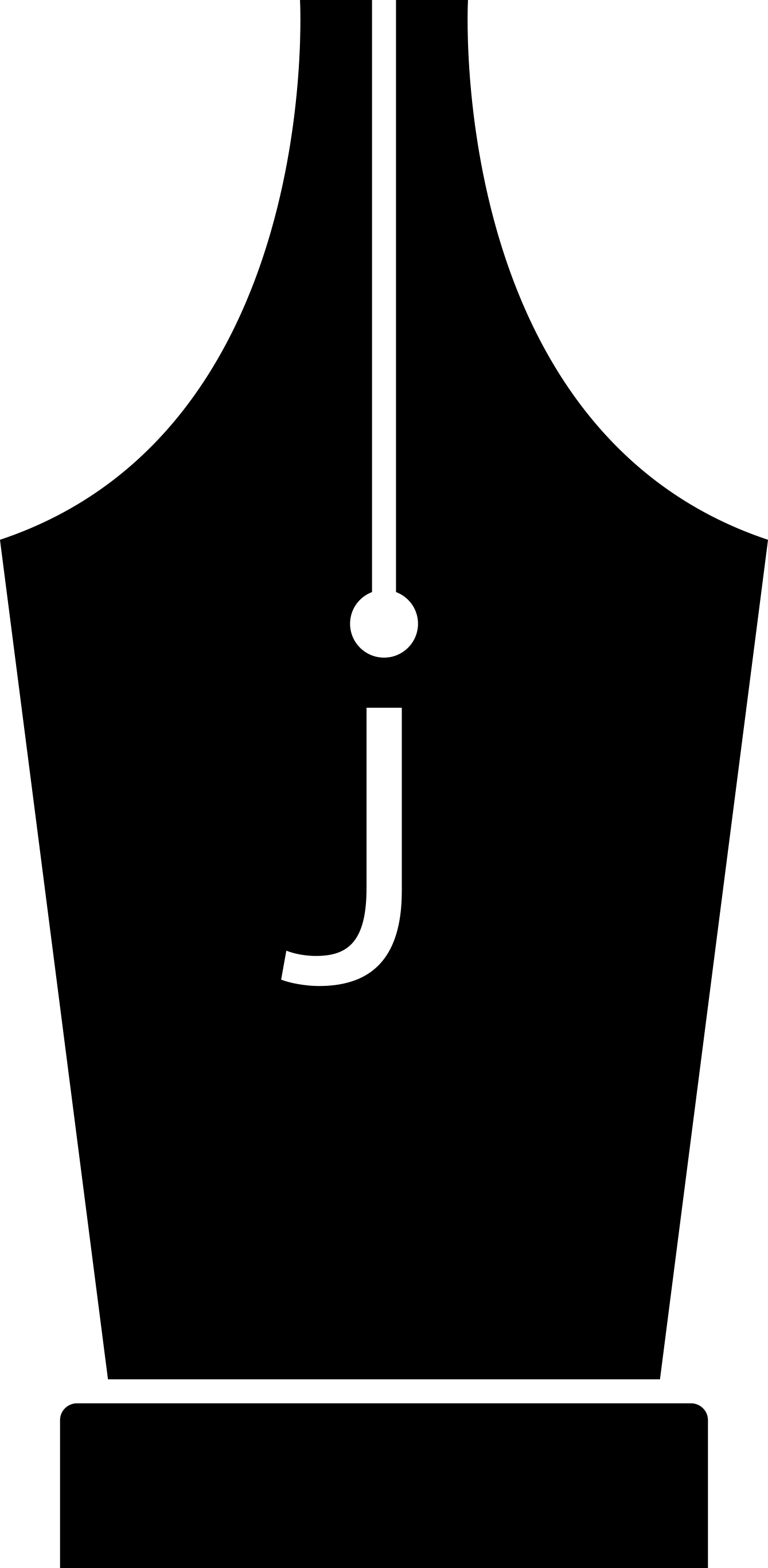[영화] 가버나움
Review
작성자
在耳
작성일
2024-08-20 04:56
조회
231
Undocumented. 킹스턴 공항에 혼자 남아 있었다. 미국에서 부친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기까지, 뚫어져라 컨베이어 벨트만 쳐다보고 있었던 작년 가을 어느 날. 가방 하나만 달랑 메고 있는 내게, 미안하다며 항공사 직원 건네 준 키엘 키트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반나절을 길 위에 보내고, 갈아입을 깨끗한 옷 한 벌이 없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증빙해줄 서류가 마땅치 않다는 것. 몇 가지 부족함 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참가비로 준비해 온 비용이 도착하지 않은 수하물에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발표 자료로 준비해온 책들이며, 하다못해 화장을 지우고 바를 로션하나 없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의 부재에 존재가 온전히 흔들리는 기분. 아닌 척하고 앉아 있었지만 컨설테이션 첫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쉽게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드류에서 온 트레이시(Traci)교수님과 인사하며 나는 컨설테이션의 불법이민자(Undocumented Person)라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수하물이 올까, 오지 않을까. 컨설테이션 마지막날 까지 수하물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날의 불안감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었다. 반나절이면 도착할 거라고 신신당부했던 항공사 직원을 떠올리며 투덜거리는 찰나, 호텔 로비로 낯익은 캐리어가 들어왔다. 어찌나 눈물나게 반갑던지!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청년 담당 디렉터인 조이가 와서 안부를 물었다. 수하물이 잘 도착했는지 물으러 왔는데, 예쁘게 화장한 네 얼굴 보니 도착한 걸 바로 알겠다며 웃었더랬다. 서류 없이 보낸 짧은 하루의 기억이 영화를 보는 내내 자인의 냄비처럼 덜덜거리며 나를 뒤쫓아왔다.
Chapped.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지나온 자리를 더듬는 것. 내가 얼굴보다 상대의 손을 더 신뢰하는 이유다. 북경을 경유하며 잠시 잡은 와이파이에, 그녀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여럿 들어와 있었다. 둘째 에즈라의 귀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고 했다. 아직 어려서 수술할 수 없지만, 이대로 가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을만큼 심각하다고 했다.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보험 없는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태어날 때부터 엄지와 새끼 손가락밖에 없었다는 에즈라. 그 아이처럼 밝은 아이는 본 적이 없을만큼, 장애가 그저 하나의 불편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만큼, 가족들의 사랑이 끈끈하게 아이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씩씩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던, 그녀가 울고 있었다. 부서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 빼꼼이 열어본 필리핀 공동체 따갈로그어 예배. 뒤돌아보던 그녀가 눈물을 훔치다가 나를 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위로하기 위해 잡은 그녀의 손은, 설명하기 어려울만큼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손에 닿는 순간, 바로 이 손의 주인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스캔될만큼. 새벽까지 이태원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2교대로 남편과 돌아가며 세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다.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너무 힘들어요."는 타국의 언어처럼 직설적으로 귀에 와 맺혔다.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몰랐기에 여기저기 더 많이 물었고, 더 많이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던 연말 여전도회 권사님이 찾아오셨다. 임원들끼리 연말에 식사하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에즈라 소식을 들었다며 한끼 식사 대신 병원비를 보태고 싶다고- 그걸 발단으로 여전도회마다 회계보고를 마치고 남은 이월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녀에게 20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도움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 치료비 800원으로 매달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Rooted.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우리 사회의 밑창에 뿌리내린 친구들. 해외 유수 대학의 총장들과 업무협약을 하거나 통역을 할 때보다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간곡하게 살피게 되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우즈벡 선생님에게 만두를 먹지 않는다고 '한국에서 살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핀잔을 주는 팀장님. 층간 소음이 생겼다고 씩씩거리며 올라와 '몽골에서 아파트에는 살아봤어요'라며 무시했다는 배불뚝이 사장님. 2013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피자는 먹어봤냐고 물어밨던 바보같던 미국 남자애. 기숙사 공동 주방 게시판에 밥솥 쓰지 말라고, 밥냄새 싫다고 휘갈겼던 어떤 글씨체. 철저히 혼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은 아주 쉽고도 익숙하게 상대를 잊어버린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 인간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어느 순간 가버나움처럼 높아져 버린 이땅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 마음이 어쩌면 가버나움을 보며, 내가 간신히 눈물을 참았던 이유였는지도 모르겠다. (2019.02)
Chapped.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지나온 자리를 더듬는 것. 내가 얼굴보다 상대의 손을 더 신뢰하는 이유다. 북경을 경유하며 잠시 잡은 와이파이에, 그녀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여럿 들어와 있었다. 둘째 에즈라의 귀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고 했다. 아직 어려서 수술할 수 없지만, 이대로 가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을만큼 심각하다고 했다.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보험 없는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태어날 때부터 엄지와 새끼 손가락밖에 없었다는 에즈라. 그 아이처럼 밝은 아이는 본 적이 없을만큼, 장애가 그저 하나의 불편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만큼, 가족들의 사랑이 끈끈하게 아이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씩씩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던, 그녀가 울고 있었다. 부서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 빼꼼이 열어본 필리핀 공동체 따갈로그어 예배. 뒤돌아보던 그녀가 눈물을 훔치다가 나를 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위로하기 위해 잡은 그녀의 손은, 설명하기 어려울만큼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손에 닿는 순간, 바로 이 손의 주인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스캔될만큼. 새벽까지 이태원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2교대로 남편과 돌아가며 세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다.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너무 힘들어요."는 타국의 언어처럼 직설적으로 귀에 와 맺혔다.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몰랐기에 여기저기 더 많이 물었고, 더 많이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던 연말 여전도회 권사님이 찾아오셨다. 임원들끼리 연말에 식사하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에즈라 소식을 들었다며 한끼 식사 대신 병원비를 보태고 싶다고- 그걸 발단으로 여전도회마다 회계보고를 마치고 남은 이월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녀에게 20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도움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 치료비 800원으로 매달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Rooted.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우리 사회의 밑창에 뿌리내린 친구들. 해외 유수 대학의 총장들과 업무협약을 하거나 통역을 할 때보다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간곡하게 살피게 되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우즈벡 선생님에게 만두를 먹지 않는다고 '한국에서 살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핀잔을 주는 팀장님. 층간 소음이 생겼다고 씩씩거리며 올라와 '몽골에서 아파트에는 살아봤어요'라며 무시했다는 배불뚝이 사장님. 2013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피자는 먹어봤냐고 물어밨던 바보같던 미국 남자애. 기숙사 공동 주방 게시판에 밥솥 쓰지 말라고, 밥냄새 싫다고 휘갈겼던 어떤 글씨체. 철저히 혼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은 아주 쉽고도 익숙하게 상대를 잊어버린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 인간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어느 순간 가버나움처럼 높아져 버린 이땅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 마음이 어쩌면 가버나움을 보며, 내가 간신히 눈물을 참았던 이유였는지도 모르겠다. (2019.02)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누가복음 10장 15절)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