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파이어. 행정상으로는 독일 라인란트 팔츠주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팔츠 주교회(Landeskirche der Pfalz)의 본부가 위치한 도시. 작년에 청년들과 종교개혁 탐방지로 왔다가 한눈에 반했던 곳이었다. 독일의 소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감성과 소박함. 슈파이어 돔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기념교회로 대표되는 개신교의 조화로움. 어쩌다 보니 본에서 시작된 독일에서의 삶의 여정이 라인강을 따라 계속 내려가는 중이다. 신기하게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독일 문화와 역사, 교회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단순히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주는 감성만은 아닐 것이다. 실재하는 삶에서 마주하는 자리들이 그만큼 온기를 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시작해 미국과 독일로 이어진 신학 공부가 벌써 13년 차다. 신대원 1학년 여름부터 시작된 사역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의 한인교회에서 경험한 것까지 헤아리면 10년이 넘는다. 이미 안수받은 목사가 낯선 언어로, 완전히 다른 교회 문화에 새롭게 적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놀라울 정도로 결정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마음은 가벼웠다. 목회자로서의 보람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모국이라는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오롯이 홀로 헤쳐 나가야 하는 이곳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왜 독일이었는가. 6년 전 그 봄의 나에게로 돌아가 다시 묻곤 했다. 그때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다. 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듯한 자리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위한 삶이었다면 애초에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진로를 택하지도 않았을 테였다. 영혼을 가진, 그리고 그 영혼의 창조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치러야 할 삶의 대가이기도 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아쉽지 않은 적도 없었다.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어가는가. 한국 교회의 구조 속에서, 신대원을 다니는 신학생들은 이른바 ‘청빙게시판’을 통해, 혹은 알음알음 소개를 통해 사역지를 결정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곳, 주말에만 사역하는 곳. 각자의 선호도와 개교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사역지는 이따금 브랜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인맥과 학연, 지연과 능력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뜻이다. 철없는 망둥이 같던 신대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봄부터 무턱대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었다. 서울의 중대형교회에서는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신대원생에게 기회를 줄 리가 만무했는데, 감사하게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정장 차림에 애정하는 성경 구절까지 암송하고 도착한 면접자리에는 유년부 부장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 장로님이 계셨다. 영어를 전공했으니 아동부 주말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말을 들으면서,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다. 적지만 면접비라며 봉투를 건네시던 목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내가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 기재된 교회 이름이 사실 서울의 큰 교회였다고 핀잔하셨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말도 안되는 큰 실수였다. 교회에서 임용하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고는, 사역자로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말로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 하마터면 첫 사역지가 될 뻔했던 어떤 자리였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떻게 사역지가 결정되는가. 국가교회, 즉 국교회(Landeskirche)라고 불리는 20여 개의 지역 국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만만치가 않다.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 세계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목회자 수급 문제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신학을 공부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줄어든다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 독일의 종합대학에서 개신교 신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몇 년 전부터 목도했던 현상을, 독일 교회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니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학을 10학기 이상 공부하고, 고전어 시험(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통과해야 하며, 1차 신학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목회자 후보생인 비카(여성의 경우, 비카린 Vikar*in)로 임용된다. 한국이나 미국의 목회학 석사 과정(Master of Divinity)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은 독특하게도 국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목회자 후보자 교육원(Predigerseminar)을 통해 기본적으로 28개월의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 훈련은 세 가지로 이뤄지는데, 먼저는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과정, 이후에 배정받는 사역지에서는 멘토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사역을 배우고, 마지막 4개월은 특별 사역을 경험한다. 내 경우는 청목 과정이 없는 독일 국교회가 처음으로 겪는 특이 케이스다. 비카린이지만 비카린이 아니라는 묘한 중간자의 자리. 사역지는 후보생의 경력과 선호도를 고려하지만, 철저히 교육원의 결정으로 배치된다. 그런 의미에서 슈파이어는 내가 가진 선택지에는 전혀 없던 도시였고, 더구나 기념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는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놀랐던 것 같다.
풍문처럼 떠도는 말이 있지 않은가. 목사라면 언제라도 이사갈 준비, 기도(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오지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이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순리일 것이다. 감자를 ‘땅 속에서 열리는 열매(Grumbeere)’라고 귀엽게 부르는, 팔츠주의 사투리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덤이다. 20251113 재이.

在耳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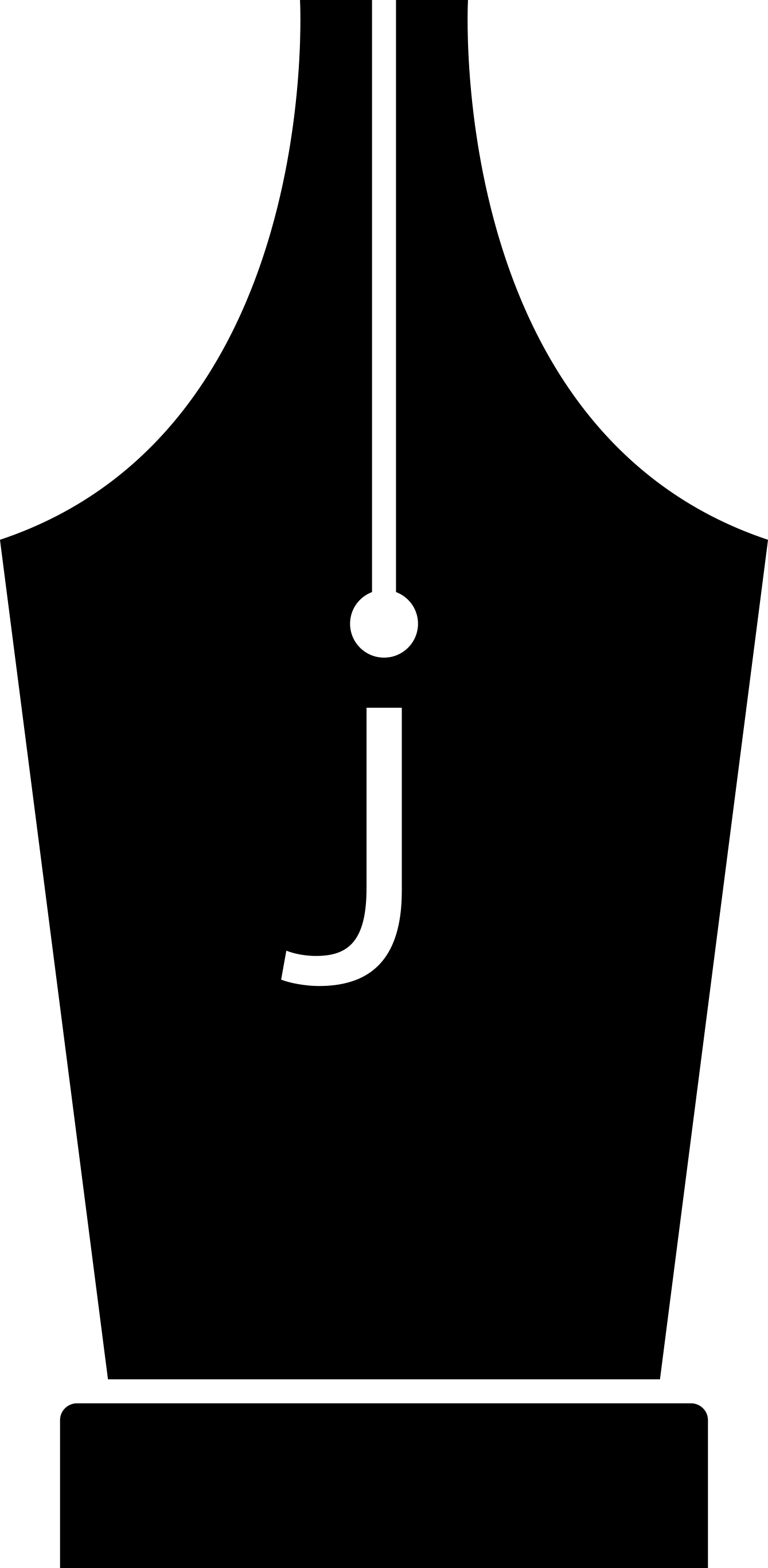
잘 읽었어요 정희경목사님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독일교회에 관한 다양한 특징들을 알수있고 한국교회와 비교하며 작성한 기록으로 에큐메니칼 배움의 귀한 자료가 되겠어요.
감사해요 교수님! 저를 위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라며 계속 써 보겠습니다 🙂
많은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귀한 배움의 자료로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배움의 조각들이지만 잘 엮어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해요.